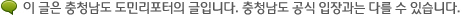마지막 인사
어머니를 배웅하며 -14
2013.01.06(일) 17:07:11 | 오명희
( omh1229@hanmail.net)
omh1229@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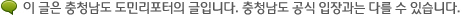
지난해 연말 31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시어머니가 세상을 뜨셨다. 평생을 함께한 당신 큰아들과 큰며느리와 손녀딸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셨다. 어언 6년이 되도록 온갖 병치레로 몸져누워 계시다 향년 90세의 나이로 저 세상으로 향하신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전날 밤의 일이다. 그날도 나는 가게에서 퇴근하여 여느 날과 같이 어머니 방에 들렀다. 그런데 어머니는 꿈나라에 가신 듯 두 눈을 꼭 감고 계셨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하루 종일 어질러 놓은 주방정리를 하고는 또 다시 어머니 방에 들어섰다. 그런데 어머니의 숨소리가 예전 같지가 않았다. 호흡 곤란이 느껴졌던 것이다. 나는 균형감각을 잃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의 마른 입술을 물티슈로 연신 닦아드렸다.
갑작스레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서둘러 근접한 거리의 시뉘네로 전화를 했다. 소도시에 살고 있는 당숙모님과 시동생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어머니 상태를 알렸다. 내심 집에서 함께 어머니를 배웅했으면 하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 이제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편히 쉬세요.” 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이 사는 시뉘들조차도 임종을 보지 못했다. 오랫동안 고생한 나머지 기력이 많이 빠지신듯 가실 땐 허망하게 떠나셨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족만이 어머니를 배웅하고 장례식장으로 모셨을 땐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황급히 달려온 피붙이들이 어머니의 빈소에서 옹기종기 마주 앉았다. 그렇게 하루를 꼬박 세우고 이튿날 아침에서야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삼일장이라 사실상 하루에 문상객들을 맞이해야 했기에 어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오랜 투병 생활로 몸도 맘도 지친 탓일까. 어머니는 막상 운명 향하실 땐 한 마디 말도 못 하셨다. 평소 내 염원대로 우리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 행여 내가 출근 후 바쁜 일상에 쫓기고 있을 때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고 늘 긴장 속에 살았는데 말이다.
발인제가 있던 날,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마을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 영구차가 우리 집 마당 한켠을 서성이다 장지를 향하자 동네 어르신들은 짧은 작별식이 못내 아쉬운 듯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칠남매 맏며느리로서 남편과 내가 어머니의 병시중을 도맡아 하며 새삼 갖게 된 좌우명이 ‘인과응보’이다. 몇 년 동안 내게 처한 혹독한 삶이 너무나 버거워 가끔은 어디론지 도망쳐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 절망감은 되레 내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고진감래’ 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며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실 수 있었음이 내 삶의 큰 보람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