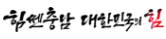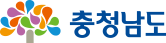해변 고을주민의 힘든 생활상 기록
[역사기획시리즈] 호산록(湖山錄) - 조선 초 서산지역 사회·경제를 말하다 [2편]
2016.12.15(목) 11:03:42관리자(jmhshr@hanmail.net)
[호산록(湖山錄)]은 1619년 서산의 사족[문벌이 높은 집안]인 한경춘·한여현 부자(父子)가 편찬한 사찬 읍지로, 1600년대 이전 서산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조선 초기 사찬 읍지가 흔치 않은 가운데 특히 충청남도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사찬 읍지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이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여 당대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다. 본지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하여 호산록을 통해 조선 초 서산지역 역사와 생활상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 서산향교의 이건 과정
임진왜란 무렵 조선의 지방 사회에서는 향리층과 양반층 간의 갈등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었다. 서산에서는 1573년 명종 태실(胎室)이 있는 태봉(胎封)의 난간이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가 시설이 해를 입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고을 수령이 파직되었는데 이를 노린 자들이 빈번히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다. 결국 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은 수령권에 도전한 백성의 짓이라 판단하여 오히려 수령을 옹호하였다. 태봉 파괴 사건 시 서산군수는 최여림(崔汝霖)이었고, 최여림은 파직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족의 향촌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리하여 최여림의 지원과 협조를 기반으로 서산향교가 이건되기에 이르렀다.
『호산록』 향교조에 의하면 향교 이건은 한영희(韓永禧)의 주도로 서산 사림들이 수차에 걸친 이건 요청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호윤(金好尹), 김호열(金好說), 박영언(朴英彦), 이유인(李惟仁), 유창수(柳昌壽), 문성해(文成海), 이첨수(李?壽) 등이 협력하였는데 이들은 대표적인 이거 사족인 청주 한씨를 비롯해 경주 김씨, 전주 이씨, 그리고 토성인 서산 유씨와 지곡 문씨였다.
= 바닷가 주민들의 생활상
서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갯벌이 펼쳐진 전형적인 해변 고을이었다. 한여현은 이런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호산록』에 해포(海浦), 해호(海戶), 해산(海産), 자염(煮鹽)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여기에 어살을 통한 고기잡이, 갯벌의 해산물 채취, 서산 등지에서 산출되는 어종, 염한(鹽漢)의 생활 등이 기록되어 있어 해변 고을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당시 서산에서 채취되는 해산물은 관에 납부해야 하는 것 말고도 관리가 가져가는 뇌물용이 많아 백성들은 매우 힘들게 살아야 했다. 어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해물 채취에 나섰는데, 농번기와 겨울에 특히 고생이 심하였다. 가난한 백성이 얇은 홑옷을 입고 맨발로 언 갯벌에 들어가 낙지와 석화를 잡고, 그래도 뇌물용 해산물이 부족하면 자사들이 장무관(掌務官)과 관원에 고해 억울하고 참혹한 형벌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들이 군대를 조련할 때 주민들에게 억지로 소금을 받아내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마을 색장(色掌)을 비롯한 땅을 가진 지주들은 관리의 수족이 되어 앞장서서 침탈을 도와주는 형편이어서 고충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대산(大山)과 지곡(智谷)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 지역이 사냥터로 유명하여, 관리와 품관(品官)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마태(馬太)·마죽, 어물과 소금을 마구 거두어 갔다.
소금을 구워 생계를 이어가는 염한(鹽漢)들도 불합리한 세금 징수에 힘겨워했다. 소금 제조 방법에는 염전을 갈아 만드는 경염(耕鹽)과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정염(井鹽)이 있다. 경염에 비해 정염이 수확량 변동이 적어 국가는 정염으로 세금을 거두고자 했으나, 염한들은 염세의 부담이 적은 경염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각처 아문에서 군대의 식량을 위해 염분(鹽盆)을 설치한 호주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염분이 반가량 황폐화된 상태에서 거의 10배에 달하는 염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 목장 주민들의 생활상
조선 초 서산에는 대산곶(大山串)과 안면곶(安眠串)에 목장이 있었다. 목장은 주변에 살고 있던 민간인들과 목장 안에서 말을 사육하는 목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목장에서 국가의 말을 사육하는 국역에 종사하던 이들을 ‘목자(牧子)’라 하였는데, 『호산록』에서는 목자를 ‘목군(牧軍)’이라 칭하였다.
목자는 목장마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준비하고 목마군(牧馬軍)에 편성되며, 지방의 특산물인 우육, 마육, 우마피 등을 토산물로 바쳐야 했다. 또 감목관, 감사, 사복시, 점마별감 등 관원의 순행에 따른 수탈도 이어져 도망하는 일이 흔할 정도였다. 목자들의 고역은 목장마를 부정으로 매각하거나, 사축(私畜)을 해서 매매하고 또 마필을 도살, 유실하였다고 거짓 보고하여 사복을 채우는 일이 많아 사회적 물의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전란의 피해로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호산록』에 나타나는 목군에 관한 기록은 다른 지방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에 관해서는 별도의 항목이 설정된 것은 아니고, 산천조의 ‘대산(大山)’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조선 초기 사찬 읍지가 흔치 않은 가운데 특히 충청남도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사찬 읍지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이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여 당대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다. 본지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하여 호산록을 통해 조선 초 서산지역 역사와 생활상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 서산향교의 이건 과정
임진왜란 무렵 조선의 지방 사회에서는 향리층과 양반층 간의 갈등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었다. 서산에서는 1573년 명종 태실(胎室)이 있는 태봉(胎封)의 난간이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가 시설이 해를 입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고을 수령이 파직되었는데 이를 노린 자들이 빈번히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다. 결국 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은 수령권에 도전한 백성의 짓이라 판단하여 오히려 수령을 옹호하였다. 태봉 파괴 사건 시 서산군수는 최여림(崔汝霖)이었고, 최여림은 파직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족의 향촌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리하여 최여림의 지원과 협조를 기반으로 서산향교가 이건되기에 이르렀다.
『호산록』 향교조에 의하면 향교 이건은 한영희(韓永禧)의 주도로 서산 사림들이 수차에 걸친 이건 요청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호윤(金好尹), 김호열(金好說), 박영언(朴英彦), 이유인(李惟仁), 유창수(柳昌壽), 문성해(文成海), 이첨수(李?壽) 등이 협력하였는데 이들은 대표적인 이거 사족인 청주 한씨를 비롯해 경주 김씨, 전주 이씨, 그리고 토성인 서산 유씨와 지곡 문씨였다.
= 바닷가 주민들의 생활상
서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갯벌이 펼쳐진 전형적인 해변 고을이었다. 한여현은 이런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호산록』에 해포(海浦), 해호(海戶), 해산(海産), 자염(煮鹽)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여기에 어살을 통한 고기잡이, 갯벌의 해산물 채취, 서산 등지에서 산출되는 어종, 염한(鹽漢)의 생활 등이 기록되어 있어 해변 고을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당시 서산에서 채취되는 해산물은 관에 납부해야 하는 것 말고도 관리가 가져가는 뇌물용이 많아 백성들은 매우 힘들게 살아야 했다. 어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해물 채취에 나섰는데, 농번기와 겨울에 특히 고생이 심하였다. 가난한 백성이 얇은 홑옷을 입고 맨발로 언 갯벌에 들어가 낙지와 석화를 잡고, 그래도 뇌물용 해산물이 부족하면 자사들이 장무관(掌務官)과 관원에 고해 억울하고 참혹한 형벌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들이 군대를 조련할 때 주민들에게 억지로 소금을 받아내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마을 색장(色掌)을 비롯한 땅을 가진 지주들은 관리의 수족이 되어 앞장서서 침탈을 도와주는 형편이어서 고충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대산(大山)과 지곡(智谷)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 지역이 사냥터로 유명하여, 관리와 품관(品官)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마태(馬太)·마죽, 어물과 소금을 마구 거두어 갔다.
소금을 구워 생계를 이어가는 염한(鹽漢)들도 불합리한 세금 징수에 힘겨워했다. 소금 제조 방법에는 염전을 갈아 만드는 경염(耕鹽)과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정염(井鹽)이 있다. 경염에 비해 정염이 수확량 변동이 적어 국가는 정염으로 세금을 거두고자 했으나, 염한들은 염세의 부담이 적은 경염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각처 아문에서 군대의 식량을 위해 염분(鹽盆)을 설치한 호주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염분이 반가량 황폐화된 상태에서 거의 10배에 달하는 염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 목장 주민들의 생활상
조선 초 서산에는 대산곶(大山串)과 안면곶(安眠串)에 목장이 있었다. 목장은 주변에 살고 있던 민간인들과 목장 안에서 말을 사육하는 목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목장에서 국가의 말을 사육하는 국역에 종사하던 이들을 ‘목자(牧子)’라 하였는데, 『호산록』에서는 목자를 ‘목군(牧軍)’이라 칭하였다.
목자는 목장마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준비하고 목마군(牧馬軍)에 편성되며, 지방의 특산물인 우육, 마육, 우마피 등을 토산물로 바쳐야 했다. 또 감목관, 감사, 사복시, 점마별감 등 관원의 순행에 따른 수탈도 이어져 도망하는 일이 흔할 정도였다. 목자들의 고역은 목장마를 부정으로 매각하거나, 사축(私畜)을 해서 매매하고 또 마필을 도살, 유실하였다고 거짓 보고하여 사복을 채우는 일이 많아 사회적 물의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전란의 피해로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호산록』에 나타나는 목군에 관한 기록은 다른 지방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에 관해서는 별도의 항목이 설정된 것은 아니고, 산천조의 ‘대산(大山)’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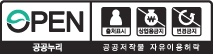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