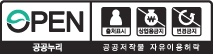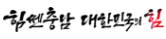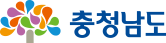천안 천호지엔 어릴적 고단했던 추억이 "자욱"
천안 12경 중 하나...나에게는 50년 세월이 흘렀어도 춘래불사춘
2011.04.03(일) 홍경석(casj007@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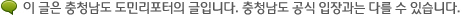
내가 10대 초반이었던 1970년대 초. 아직은 아스팔트가 낯설고 푸른 냇가에서는 아이들이 발가벗고(한여름엔) 물고기를 잡았으며 저녁 무렵엔 모기를 쫓는 마른 솔가지 타는 냄새가 하늘로 비상하던 시절이었다. 사람 사는 일은 늘상 고달팠고 그래서 아이들은 사금파리에 잡곡이 숭숭 박힌 밥을 먹으며 일 나간 부모님을 기다렸다.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가르치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일터에 나가 허리가 휘도록 밭과 논두렁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산다는 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었다. 그처럼 치열하게 일을 했어도 살림은 도통 불어날 줄 몰랐다. 다만 불변한 건 지독스런 가난만이 붙박이로 고착화되었을 따름이다.
지금은 모 대학교가 그 뒤에 위치한 저수지인 ‘천호지’가 있다. 한데 그 저수지는 늘상 그렇게 자욱한 슬픔만을 담고 있었다. 그 저수지가 유난스레 슬펐던 건 해마다 5월 8일 ‘어머니 날’(지금은 어버이 날이지만 당시엔)을 맞으면 그 감흥이 더 했다. 왜냐면 나에겐 엄마가 없는 때문이었다. 혹자가 이르길 엄마는 하늘이 천사를 대신해 보낸 사람이라고 했다.
그랬음에도 나에겐 그 엄마가 존재하지 않았다. 생후 첫돌을 즈음해 ‘사라진’ 엄마는 나에게 무수한 생채기와 더불어 이 풍진 세상을 너무도 일찍 알아버리게끔 방기(放棄)한 분노와 원망의 존재이자 진원지였다. 석가모니께선 ‘분노를 삭이지 못 하는 것은 시뻘겋게 달구어진 숯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다’며 이를 피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내가 신이 아닌 이상에야 그같은 이상(理想)을 인간인 내가 구태여, 그리고 일부러까지 찾아서 할 필요는 없었다. 아무튼 그래서 ‘어머니 날’의 하교 뒤 일부러 찾은 저수지는 나의 참담한 현실을 새삼 곱씹게 하면서 눈물로 점철된 내 마음의 옷깃을 채우는 계기와 단초의 원인으로까지 다가오기 일쑤였다.
아울러 저수지 위로 펼쳐지는 푸른 하늘로는 나의 그러한 슬픔을 고스란히 껴안고 있는 검은 구름이 두둥실거렸다. 여자는 누구라도 한 번은 딸이 되고 아내가 되며 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결국엔 할머니까지 되는 운명을 가졌다. 그렇거늘 왜 내 엄마는 할머니가 된 지금까지도, 그리고 어언 50년이 넘은 장구한 세월이 여류함에도 이 아들을 ‘찾지’ 않으시는 것일까?
천안 12경(景)으로도 지정된 '천호지'를 일전 동창생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 대서 천안에 갔다가 오는 길에 잠시 들렀다. 봄바람이 제법 찰랑거렸다. 그러나 그 바람이 나로선 여전히 엄동설한의 한풍(寒風)에 다름 아니었다. 결국 그 바람에서 나는 다시금 여전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어떤 미친 존재감을 새삼 곱씹지 않으면 안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