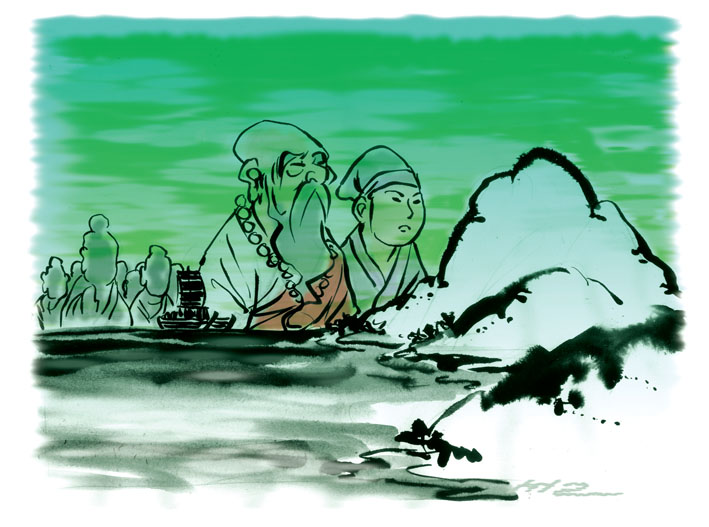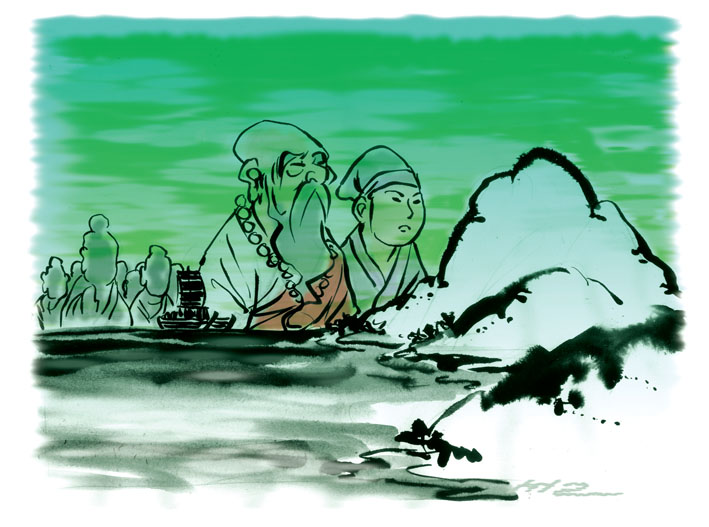

“화문이란 젊은이가 황제 이치를 암살하려다 실패해 잡혔다네. 그런데 그 젊은이의 입에서 의각 자네 이름이 나왔다는 게야. 해서 각 지방에 방을 붙여 자네를 찾고 있다네. 그러니 어서 서둘러 백제로 돌아가도록 하게.”
의각대사의 입에서 낮은 불호소리와 함께 깊은 한 숨이 터져 나왔다.
“화문이 결국 그리됐구나.”
단은 오금이 저려왔다. 또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제 황제의 쫓김을 당하게 됐으니 앞날이 그저 캄캄하기만 했다.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땅에서 빨리 벗어나고만 싶었다.
“내 마차는 준비하라 일렀네. 그러니 자네는 빨리 포구로 가서 배를 준비하도록 하게.”
말을 마치고 가해대사는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다.
“황금일세. 이거면 배를 한 척 살 수 있을 것이네.”
“대사님.”
의각대사는 고마움에선지 말을 잇지 못했다.
“다 백제를 위한 일일세. 우리가 속세를 버리고 출가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 낳아 준 땅에 대한 의리마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게야. 그러니 네일 내일 따지지는 마세나.”
의각대사는 가해대사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아꼈다.
“네가 이곳에서 마차에 석불을 싣고 지주(池州)로 오너라. 난 포구로 가 배를 구하마.”
의각대사는 서둘러 지주(池州)포구로 떠났다.
의각대사가 떠나자마자 마차가 당도했다. 한 두 대도 아니고 모두 다섯 대나 되었다. 단은 마부들과 서둘러 석불을 실었다. 모두 삼천오십삼불이었다. 다행히 황제의 근위병이 구자산에 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모양이었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지주포구에는 이미 의각대사가 배를 준비시켜 놓고 있었다. 석불을 싣기에 적당한 규모였다. 석불을 모두 옮겨 싣자 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가해대사는 포구에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체될까 염려해서였다.
석불을 실은 배는 바람을 받고 강을 따라 내려갔다. 바람도 적당히 불어 배는 나는 듯이 바다를 향해 치달려 내려갔다. 단은 키를 잡고 의각대사는 이물에 앉아 염불을 외웠다. 무사히 백제 땅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비는 것이다.
거친 물살을 따라 내려가자 드넓은 장강 하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바다에 다다른 것이다. 단은 가슴이 뛰었다. 이제 저 바다만 건너면 다시 백제 땅에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했던 연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의각대사는 장강 포구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바다로 들어섰다. 다행히 바람이 적당했다. 모두 부처님의 도움이라 단은 생각했다.
바다로 들어서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저 지긋지긋한 대륙을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염불만을 외워대고 있는 의각대사에 단은 경외감마저 느꼈다. 적당한 바람이 꼭 의각대사가 부르는 신풍만 같았다.
배는 마치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받은 듯이 바람처럼 동쪽으로 나아갔다. 해가 지고, 달이 뜨자 단은 지난번 바다를 건너던 때가 생각났다. 그리고 은빛 물결은 또 다시 그때의 신비로움을 가슴 속에 아로새겨 놓았다.
부서지는 별빛과 은은한 달빛이 바다를 온통 신비로운 물결로 가득 채워놓았다. 일렁이는 파도는 은빛 주단을 깔아놓은 듯 했다. 석불을 실은 배는 그 은빛 주단 위를 미끄러지듯이 잘도 나아갔다. 한참을 바라보자 문득 무채색의 두려움이 단의 가슴속에 일었다. 단은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다. 키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눈을 부릅떴다. 검은 하늘에는 온통 별빛과 달빛뿐이었다.
바람이 점점 거세어졌다. 키를 잡은 단의 손도 버거워졌다.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외물(外物)은 눈 밖의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외물은 그저 밖의 것에 불과하게 보이느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키를 잡아라.”
파도가 일어서고 바람이 거세어지기 시작했다. 구름도 없는 하늘에 난데없는 폭풍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단은 두려움에 얼굴이 노래졌다.
그러나 의각대사는 여전히 이물에 앉아 염불만을 외워대고 있을 따름이었다. 단은 의각대사의 말을 되 뇌이며 키를 움직였다. 파도가 일어서는 곳으로 배를 움직여 배가 난파하는 것을 막았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일어설 때마다 단의 눈은 커졌다 작아졌다 정신이 없었다.
그러자 두려움도 사라졌다. 오직 배를 안전하게 몰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단의 가슴 속을 지배했던 것이다. 사납던 파도가 잦아들고 바다는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평온을 되찾았다.
“저 곳으로 키를 돌려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의각대사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단은 키를 움직였다. 어떻게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잡는 지, 단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늘과 물만 보이는 곳에서 의각대사는 방향을 정확하게도 찾아냈다.